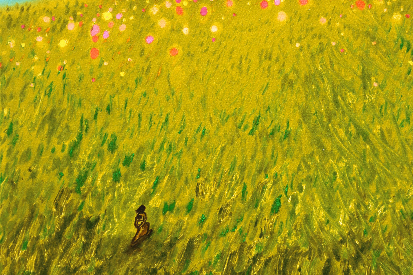발행일 검색
- 2023년 1월(3)
- 2024년 6월(1)
- 2025년 12월(7)
- 2022년 7월(6)
- 2024년 7월(4)
- 2025년 2월(4)
- 2020년 8월(6)
- 2020년 5월(5)
- 2022년 5월(4)
- 2024년 5월(8)
- 2023년 10월(5)
- 2024년 10월(3)
- 2025년 4월(4)
- 2023년 9월(2)
- 2025년 9월(5)
- 2023년 6월(2)
- 2024년 12월(4)
- 2022년 10월(4)
- 2024년 3월(1)
- 2023년 12월(2)
- 2023년 5월(6)
- 2021년 7월(4)
- 2024년 9월(2)
- 2021년 4월(5)
- 2025년 1월(2)
- 2025년 10월(4)
- 2023년 7월(2)
- 2021년 8월(5)
- 2024년 11월(5)
- 2022년 9월(4)
- 2020년 11월(4)
- 2021년 10월(3)
- 2020년 9월(5)
- 2022년 1월(4)
- 2022년 12월(3)
- 2022년 2월(5)
- 2021년 11월(4)
- 2023년 4월(4)
- 2022년 8월(4)
- 2022년 11월(2)
- 2025년 8월(1)
- 2022년 3월(5)
- 2025년 6월(5)
- 2024년 4월(5)
- 2021년 12월(5)
- 2020년 7월(6)
- 2023년 2월(2)
- 2024년 2월(3)
- 2024년 8월(2)
- 2025년 7월(4)
- 2025년 3월(3)
- 2020년 10월(6)
- 2020년 12월(5)
- 2021년 1월(5)
- 2021년 9월(5)
- 2024년 1월(4)
- 2021년 2월(5)
- 2021년 5월(5)
- 2023년 8월(4)
- 2023년 11월(3)
- 2025년 5월(3)
- 2022년 6월(3)
- 2023년 3월(7)
- 2026년 1월(5)
- 2025년 11월(2)
- 2022년 4월(4)
- 2021년 3월(4)
- 2020년 6월(6)
- 2021년 6월(5)
노년의 신체를 둘러싼 웃지 못 할 가족극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하찮음>(2021)
약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은 모두의 곳곳에 도사린다. 직접 겪지 않는 이상, 쉬이 알 수 없는 사회의 문제들과 내면의 고통. 이번 영화는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준다. 영화제 개막작으로 미개봉인 점이 아쉽지만, 언젠가 기회가 허락한다면 이 리뷰를 떠올려 함께 보길 추천한다. 편집자 주.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칠레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하찮음>은 노년의 신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해프닝을 그려낸 블랙 코미디이다. 그런데 이 영화, 조금 이상하다. 지나치게 냉소적이다. 죽음의 위기를 맞는 노년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거나 격정적인 감정은 커녕, 위기조차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긴급한 상황을 느슨하게 그린다거나 긴장감을 최대한 배제하는 극의 전개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극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어떤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저 감정 동요 없이 마냥 흘러가는 전개에 당혹감을 느끼다가도 또 어느 순간 주인공의 주변인들이 내뱉는 실없는 소리들을 듣고 있자면 나도 모르는 웃음이 피식 나오게 되는, 그만큼 생소한 형식의 영화이긴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높낮이 없는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병약한 신체’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이 사회의 시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감지하는 예리함과 명철함이 있다. 이는 우리가 약자가 되어보지 않는 한 절대 느낄 수 없는 순간을 말한다. 더불어 삶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과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실질적인 울림을 건넨다.

주인공과 가족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은 상황 속에서 점차 높아진다. 출처: 네이버영화
영화 속으로
저명한 안과의사 세르히오(헥터 노구에라)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인물이다. 지긋한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저명한 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학자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이다. 그러나 업적에 비해 실상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미숙한 편이다. 환자들을 치료의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는 매사에 무척 사무적이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정작 마음은 가족을 사랑하겠지만 매순간 무시와 지적, 꾸지람을 입에 달고 사는 그에게 가족 구성원은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대한다. 한마디로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긴장감이 그들 곁에 머무르는 느낌이다. 어느 날, 물건을 옮기기 위해 의자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진 세르히오는 몸에 충격을 심하게 입어 병원 진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은 그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그는 며칠 후 퇴원을 하게 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퇴원한 그는 점차 몸이 굳어가게 되어 가족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세르히오는 스스로 파킨슨병을 의심하지만 담당의사는 다른 병명으로 간주하여 그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의 상태. 결국 그는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야기는 주인공 세르비오의 일상에서부터 비일상적인 상황으로 흐른다. 출처: 네이버영화
약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부조리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를 환자의 시선으로 고발한 미구엘 코토의 <고통 받는 환자들>을 각색한 이 작품은 국내에 소개되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하찮음>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아마 제목을 보며 직관적으로 밀란 쿤데라 소설을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이 영화의 영문제목은
“왜 저희 남편은 치료해주지 않는거죠?” 한 여인이 등장해 위와 같은 말을 건넨다.
극중 세르히오가 의사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다.
슬픔에 가득찬 이 여인을 바라보던 의사는 조용히 말한다. “당신 남편은 이제 곧 죽을테니까요.”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소실된 채, 병약한 존재로 추락한 세르히오에게 이 말은 비극의 서막을 감지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타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의 신체를 바라보며, 제목처럼 분노와 무기력함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사회적 약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미처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다. 출처: 네이버영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때
노년의 신체를 둘러싼 희비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는 ‘시선’이 가진 불완전성 또한 고민한다. 커다란 환자의 눈이 클로즈업 되며 시작되는 오프닝. 이는 생각보다 큰 임팩트를 가져다준다. 눈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진실로 판명한다. “분명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 말 만큼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은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오프닝에 등장하는 눈의 주인은 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병원을 찾아온 상황이다. 결국 눈으로 본다고 한들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보는 방식과 의도, 즉 ‘시선’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될 수 있음을 이 오프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그러기에 인상적인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시선의 변화를 가져온 세르히오 그 자체일 것이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회 시스템적 해결방식으로 안락사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본인이 안락사의 대상이 될 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완전한 변화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그간 잘못된 치료였음이 판명난 후 회복기를 거치는 세르히오는 이전에 하던 논문 작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그의 시선은 철저하게 환자들의 존엄과 그들의 목소리를 위주로 바라보게 된다.
보지 못하던 것을 비로소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에 대한 해답은 모두 각자의 것임을 시사한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장다나 영화 칼럼니스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CJ CGV아트하우스 큐레이터와 복합문화공간 다락스페이스의 프로그래머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 외래교수,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 <모두를 위한 기독교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