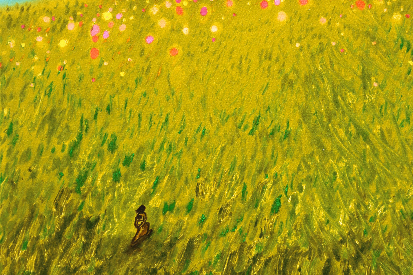발행일 검색
- 2022년 1월(4)
- 2021년 12월(5)
- 2020년 7월(6)
- 2024년 11월(5)
- 2023년 2월(2)
- 2024년 2월(3)
- 2024년 8월(2)
- 2025년 7월(4)
- 2025년 8월(1)
- 2022년 3월(5)
- 2025년 6월(5)
- 2024년 4월(5)
- 2025년 11월(2)
- 2022년 4월(4)
- 2021년 3월(4)
- 2020년 6월(6)
- 2021년 6월(5)
- 2020년 10월(6)
- 2020년 12월(5)
- 2024년 1월(4)
- 2021년 1월(5)
- 2021년 9월(5)
- 2025년 3월(3)
- 2021년 5월(5)
- 2021년 2월(5)
- 2023년 11월(3)
- 2023년 8월(4)
- 2022년 6월(3)
- 2025년 5월(3)
- 2026년 1월(5)
- 2023년 3월(7)
- 2023년 10월(5)
- 2023년 9월(2)
- 2025년 9월(5)
- 2023년 6월(2)
- 2024년 12월(4)
- 2022년 10월(4)
- 2024년 3월(1)
- 2023년 5월(6)
- 2023년 12월(2)
- 2023년 1월(3)
- 2025년 12월(7)
- 2024년 6월(1)
- 2022년 7월(6)
- 2024년 7월(4)
- 2022년 5월(4)
- 2024년 5월(8)
- 2024년 10월(3)
- 2020년 5월(5)
- 2020년 8월(6)
- 2025년 2월(4)
- 2025년 4월(4)
- 2022년 2월(5)
- 2021년 11월(4)
- 2022년 8월(4)
- 2023년 4월(4)
- 2022년 11월(2)
- 2025년 1월(2)
- 2021년 7월(4)
- 2024년 9월(2)
- 2021년 4월(5)
- 2025년 10월(4)
- 2023년 7월(2)
- 2021년 8월(5)
- 2020년 11월(4)
- 2022년 9월(4)
- 2020년 9월(5)
- 2021년 10월(3)
- 2022년 12월(3)
어느 나라의 행복한 장례식
아무리 죽음과 삶을 밀접하게 여긴다 한들 장례식이 마냥 행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과 모습일 수 있다면? 어느덧 ‘행복한 장례식’이 통념이 된 영국 사회, 그들의 ‘웰빙 그리고, 웰엔딩’ 이야기.
인간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을 우리는 보통 웰빙(well-being)이라고 부른다. 웰빙하는 일은 결국 건강하게 삶을 사는 일이 우선이다. 건강은 평소에 꾸준히 오랫동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년을 대비한 재산 형성도 중요하다. 이 또한, 꾸준히 일찍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웰빙은 결코 짧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웰빙의 가장 큰 조건은 사람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주위에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외로움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한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무엇을 하든 이해해 주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버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가족이든 주위 사람이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세어 나가 버린다. 하지만, 이 같은 웰빙의 조건들을 일찌감치 잘 관리하고 살아 왔다면 비록 죽음이라도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난 웰엔딩(well-ending)이 될 수 있다. 웰엔딩이란 웰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발한발 자신의 삶의 끝을 향해 나가는 일로, 죽음에 능동적인 의미이다. 보통 죽는 일은 미리 정할 수 없고 느닷없이 닥치기에 수동적이라고도 하지만, 이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여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없애는 웰엔딩은 죽음 준비의 웰다잉(well-dying)보다도 한층 더 능동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웰엔딩은 결코 어렵지 않다. 바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웰빙’이 바로 웰엔딩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당신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묵은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 하지 않겠는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는데 권력과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겠으며, 재산이 많다 한들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 결국 웰엔딩 할 방법은 웰빙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웰빙의 삶을 살다 보면 결정적으로 웰엔딩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다. 바로, 가까운 친구들의 부고가 전해지는 순간이다. 이제 자신의 장례식을 비롯한 웰엔딩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영국인들의 경우 거의 다 생전에 유서를 준비한다. 이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다. 영국에서 유서 없는 유산 처리는 정말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이 나서서 고인과 관련이 있을 듯한 친족의 존재 유무의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야 유산은 직계 가족에게 상속이 된다. 그러므로 유서 준비도 누구나 다 한다.

또, 영국인들은 비록 매주 예배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유전자 기독교 철학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초연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영국인의 장례식은 결코 슬프지만 않고 차라리 축제에 가까운 장례식도 많다. 이를 일러 영국에서는 ‘행복한 장례식(happy funeral)’이라고 부른다. 고인과 유족이 조문객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하지만 않고 축제처럼 지내길 원하는 까닭이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어릴 때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과 영상까지 보여주며 고인의 생애를 추억하는 ‘생의 축전(celebration of life)’과 같이 장례식을 치른다. 심지어는 마지막을 불꽃놀이로 수놓는 거의 완벽한 축제 분위기의 장례식도 있다.
2014년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축제 같은 장례식을 원하고, 그중에서도 48%는 취미나 응원하는 축구클럽 등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장례식을 원한다고 했다. 한 예로, 항공기 정비사이자, 블랙풀(Blackpool) 축구 클럽 팬이었던 사람의 장례식을 들 수 있다. 장례식은 화장 후 블랙풀 클럽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미니 항공기에 고인의 골분을 담아 이를 실은 트럭이 고인이 즐겨 찾던 블랙풀 축구장 안을 한 바퀴 돌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영국의 장의사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이처럼 특이한 장례식의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영국인들은 태어날 때는 영문도 모르고 고난의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졌지만 갈 때만은 죽음에 끌려가지 말고 내 의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일찍부터 설계해서 살아가듯이 죽음도 대비하고 장례식마저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부의금이 따로 없는 영국에서는 스스로 장례식 경비도 일찍부터 보험을 들어 유족의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차분하게 자기 죽음을 준비한 뒤 조문객들에게 즐거운 파티를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세상을 뜬다.
영국인들은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즐겨 쓰는 조사로 ‘곧 다시 만날 때까지(till we meet again soon)’가 있다. 이 말처럼 장례식에서도 고인과 조문객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떠나고 또, 보낸다.
권석하 칼럼니스트
재영칼럼니스트.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영국의 정치, 역사,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영국인도 따기 어렵다는 예술문화역사 해설사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의 여러 매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문화권 전반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영국인 재발견 1, 2권>, <유럽문화 탐사>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