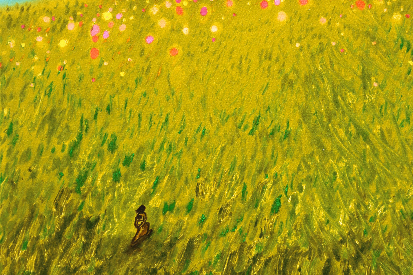발행일 검색
- 2023년 12월(2)
- 2023년 5월(6)
- 2025년 3월(3)
- 2022년 10월(4)
- 2024년 3월(1)
- 2023년 6월(2)
- 2024년 12월(4)
- 2023년 9월(2)
- 2025년 9월(5)
- 2023년 10월(5)
- 2024년 10월(3)
- 2025년 2월(4)
- 2020년 5월(5)
- 2020년 8월(6)
- 2024년 7월(4)
- 2022년 5월(4)
- 2024년 5월(8)
- 2025년 4월(4)
- 2022년 7월(6)
- 2024년 6월(1)
- 2025년 12월(7)
- 2023년 1월(3)
- 2022년 11월(2)
- 2023년 4월(4)
- 2022년 8월(4)
- 2021년 11월(4)
- 2022년 2월(5)
- 2022년 1월(4)
- 2022년 12월(3)
- 2021년 10월(3)
- 2020년 9월(5)
- 2022년 9월(4)
- 2020년 11월(4)
- 2021년 8월(5)
- 2024년 11월(5)
- 2023년 7월(2)
- 2021년 4월(5)
- 2025년 10월(4)
- 2021년 7월(4)
- 2024년 9월(2)
- 2025년 1월(2)
- 2025년 7월(4)
- 2024년 2월(3)
- 2024년 8월(2)
- 2023년 2월(2)
- 2020년 7월(6)
- 2021년 12월(5)
- 2024년 4월(5)
- 2025년 6월(5)
- 2022년 3월(5)
- 2025년 8월(1)
- 2021년 6월(5)
- 2020년 6월(6)
- 2021년 3월(4)
- 2022년 4월(4)
- 2025년 11월(2)
- 2023년 3월(7)
- 2026년 1월(5)
- 2022년 6월(3)
- 2023년 8월(4)
- 2021년 2월(5)
- 2021년 5월(5)
- 2023년 11월(3)
- 2025년 5월(3)
- 2021년 1월(5)
- 2021년 9월(5)
- 2024년 1월(4)
- 2020년 10월(6)
- 2020년 12월(5)
컬처
2025-12-06
그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울었다 <홀리 모터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보는 영화들
1. 그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꺼이꺼이 울었다 <홀리 모터스>
전 대본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았던 영화를 설명하기보다, 만들 영화를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요. 그래서 에덴미디어에서 영화 소개 글을 의뢰받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어떤 시선으로, 누구에게 소개하지?”
지금 우리는 ‘보고 싶은 것’보다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장, OTT, 유튜브, 숏폼까지. 별점은 쏟아지고 리뷰는 넘쳐나지만 정작 OTT를 켜면 볼 만한 건 없고, 스크롤을 내리다 결국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틀곤 합니다. 언젠가 강렬하게 나를 건드렸지만 이제는 흐릿해진 영화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던 ‘그때의 나’와 함께 다시 돌아보자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제는 A.I까지. 브레이크 없는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건 잠시의 ‘돌아봄’일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돌아본 영화는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2012년 작품 〈홀리 모터스〉입니다.
씨네필에겐 사랑받지만, 대중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20대에 만든 〈소년, 소녀를 만나다〉, 〈나쁜 피〉, 〈퐁네프의 연인들〉로 ‘프랑스의 천재 감독’이라 불렸고, 1999년 〈폴라 X〉 이후 오랜 침묵 끝에 13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기도 하지요.

이미지 출처 : www.themoviedb.org
이 영화를 저는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았습니다. 그 시절, 영화제는 작품을 깊이 즐기는 예술의 장이라기보다 젊음의 흥청거림이 먼저였고, 며칠을 보내다 보면 피로가 쌓여 마지막 날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속죄하듯 남은 티켓을 들고 아무 영화나 한 편 골라 본 뒤 서울로 돌아오곤 했지요. 그날 선택지로 남아 있던 영화는 단 두 편. 이탈리아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와 좌석이 많이 남아 있던 〈홀리 모터스〉.
“예술영화 지루하지 않겠어?”
“그냥 서울 올라갈까?”
“그래도 13년 만에 만드는 작품이면 이를 갈고 만들지 않았겠나?”
“아무거나 보자. 보다가 졸면 깨워줘.”
일행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피노키오〉는 매진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화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오스카’라는 남자가 하루 동안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며 아홉 개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사업가, 구걸하는 노파, 모션캡처 배우, 미치광이, 왕따 딸의 아버지, 연주자, 희생자, 암살자, 죽어가는 노인까지. 기승전결이 거의 없는, 감독의 기억과 상징이 흩어진 에피소드 구조이지요. 난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당시 저도 첫 장면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잠에서 깬 감독(레오스 카락스 본인)이 벽을 열고 들어가면 극장이 나오고, 그 안에는 시체처럼 앉아 있는 관객들, 지나가는 아기, 개 한 마리. 관객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듯한 장면들.
“역시 그래서 표가 남았던 걸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드니 라방이 표현하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죽기 싫다고 중얼대는 노파, 괴수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션캡처 배우, 무덤가에서 모델을 납치하는 녹색 옷의 미치광이, 그리고 딸을 위로하기보다 꾸짖는 아버지까지. 드니 라방의 연기는 단순한 훌륭함을 넘어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러 ‘오스카가 연기한 인물’과 ‘오스카 본인’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앞서 연기한 인물들을 죽이고, 새로운 인물도 죽어갑니다. 누구와 누구인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은 곧 연민이 되었습니다. 관객의 혼란이 오스카의 혼란이었고, 감정의 잔여물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그의 고단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오늘 몇 개의 얼굴로 살았지?”
아홉 개의 인생을 살아내고 퇴근하는 길, 오스카는 같은 일을 하는 듯한 여성 ‘진’을 만납니다.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 머리, 진짜야?”
“아니, 노인 분장이야.”
“그 눈은?”
“오늘 밤 죽게 될 스튜어디스의 눈이지.”
그리고 진은 노래합니다.
저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울었습니다.
다른 관객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옆자리 친구가 왜 우냐고 묻는데, 저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번에도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Who were we, who were we…”
우리는 누구였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돌아갈 수 없는 관계들, 쌓여온 감정의 잔여물들,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밀려오며 응답 없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마친 오스카는 일당을 받고, 침팬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황당한 설정이지만, 그보다는 내일도 또 다른 얼굴을 살아내야 할 오스카가 더 측은했습니다. 리무진 운전자는 ‘홀리 모터스’라는 회사에 차량을 주차한 뒤, 가족으로 보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마치고 가면을 쓰고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집으로 가는 저 여인도 가면을 써야만 하는구나.”
그 생각이 아릿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주차된 리무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젠가 폐차될 운명을 속삭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기묘하지만, 바로 그 기묘함 때문에 이 영화는 잊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질문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코스요리를 맛보듯 에피소드마다 다른 감정의 결이 드러납니다.
레오스 카락스의 개인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쁨, 슬픔, 공포, 사랑, 분노, 후회 같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니까요.
이 영화는 많은 평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홀리 모터스〉는 ‘나의 삶 자체’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얼굴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친구, 동료, 부모, 연인…
그 속에서 쌓이는 감정의 잔여물은 하루의 끝에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하루는 하나의 인생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질문이 오래 남습니다.
“Who were we.”
우리는 누구였을까.
또,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아냈을까.
언젠가 이 영화를 보게 될 누군가에게도,
이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이안규 감독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영화 〈미옥〉(각본·감독), 〈그대 이름은 장미〉(각색), 단편 〈사랑의 집〉 등을 통해 섬세한 연출 감각을 보여왔으며, 시체스 판타스틱 영화제 포커스아시아 최우수작품상(2017),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스릴러상 특별언급(2018)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영화와 연극 현장을 두루 거쳤으며 장르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연출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