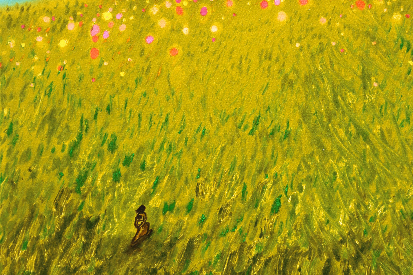발행일 검색
- 2025년 8월(1)
- 2022년 3월(5)
- 2025년 6월(5)
- 2024년 4월(5)
- 2021년 12월(5)
- 2020년 7월(6)
- 2023년 2월(2)
- 2024년 8월(2)
- 2024년 2월(3)
- 2025년 7월(4)
- 2020년 12월(5)
- 2020년 10월(6)
- 2024년 1월(4)
- 2021년 1월(5)
- 2021년 9월(5)
- 2025년 3월(3)
- 2021년 5월(5)
- 2021년 2월(5)
- 2023년 11월(3)
- 2023년 8월(4)
- 2022년 6월(3)
- 2025년 5월(3)
- 2026년 1월(5)
- 2023년 3월(7)
- 2025년 11월(2)
- 2022년 4월(4)
- 2021년 3월(4)
- 2020년 6월(6)
- 2021년 6월(5)
- 2023년 1월(3)
- 2025년 12월(7)
- 2024년 6월(1)
- 2022년 7월(6)
- 2024년 7월(4)
- 2022년 5월(4)
- 2020년 5월(5)
- 2020년 8월(6)
- 2024년 5월(8)
- 2023년 10월(5)
- 2024년 10월(3)
- 2025년 2월(4)
- 2025년 4월(4)
- 2023년 9월(2)
- 2025년 9월(5)
- 2023년 6월(2)
- 2024년 12월(4)
- 2022년 10월(4)
- 2024년 3월(1)
- 2023년 5월(6)
- 2023년 12월(2)
- 2025년 1월(2)
- 2021년 7월(4)
- 2024년 9월(2)
- 2021년 4월(5)
- 2025년 10월(4)
- 2023년 7월(2)
- 2021년 8월(5)
- 2020년 11월(4)
- 2022년 9월(4)
- 2020년 9월(5)
- 2021년 10월(3)
- 2022년 12월(3)
- 2022년 1월(4)
- 2024년 11월(5)
- 2022년 2월(5)
- 2021년 11월(4)
- 2022년 8월(4)
- 2023년 4월(4)
- 2022년 11월(2)
예술은 죽음의 유물이다
흔히 예술은 삶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삶을 그리는 예술가는 결국 죽음에 관한 사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해, 책 <죽음을 그리다>를 통해 예술에 담긴 죽음의 장면들을 이야기한 이연식 작가가 죽음을 바라보는 낯설고 새로운 시선을 전해 주었다.
망자를 보낸 이들은 뒤에 남겨진다. 죽음을 둘러싼 모든 감정은 뒤에 남은 이의 것이다. 죽음은 모두를 뒤에 남긴다. 예술은 뒤에 남은 흔적이다.
예술은 그 근본에서 죽음과 관련 깊다. 인간은 예술을 통해 죽음을 파악하려 했다. 혹은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온갖 회화와 조각, 공예품은 대부분 죽은 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이집트의 벽화는 죽은 이가 영원히 살아가도록 현세를 재현했다. 죽은 이가 혹시라도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갈까 두려워 이집트 사람들은 가능한 한 ‘완전하게’ 죽은 이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집트 화가들이 사람을 그릴 때 머리는 항상 측면, 어깨와 몸통은 정면, 허리 아래 부분은 다시 측면, 이처럼 일견 괴상하게 그린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망자를 젊은 모습으로 그린 것도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이었다. 늙은 모습으로 그렸다가는 망자가 사후에 영원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다.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의 힘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순진한 시대였다.
이집트인들이 공들여 만든 미라는 물론 시신을 훌륭하게 보존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미라는 온전히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한 채 이승과 저승 사이에 누운 모습처럼 보인다.

오귀스트 페이앙 페랭, <샤를 용담공의 시신을 발견하다>, 1865년, 낭시 미술관
죽은 자는 산 자의 처분에 맡겨진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하는 자리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놀랐다. 할아버지는 작업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마치 대중목욕탕에서 한잠 청하는 남자들처럼.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는 낭시 전투에서 숨을 거둔 부르고뉴 공 샤를(샤를 용담공)의 시신이 발견되는 장면이 묘사된다. 시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그 장면은 더욱 처연했다. 얼굴은 늑대에게 물어 뜯겼고, 무엇보다 시신은 아무 것도 걸치지 않았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전투를 벌이다 포위되어 숨진 제7기병대의 커스터 중령 또한 나중에 발견된 시신은 알몸이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병상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장면만 떠올린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거나, 위험을 피해 도망치다가, 혹은 습격을 당해서, 전쟁에 나섰다가 죽는다. 그리고 죽은 이는 오로지 산 자의 처분에 맡겨진다. 전장에서 패배와 함께 죽은 이들의 시신은 모욕당하고 약탈당한다. 이것이 죽음의 결과다. 그렇다면 죽음은 삶의 결과일까?

(좌)라인 강 상류의 장인, <죽은 연인들>, 16세기, 스트라스부르 미술관, (우)작자 미상, <구소시에마키>, 13세기, 규슈 국립박물관
시신은 부패한다. 살아남은 이들은 눈을 돌리고 코를 막으며 서둘러 물러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신에 붙들린 눈은 돌리기 어렵다. 죽음의 냄새는 산 자들에게 스며든다. 과거에는 부패한 시신을 그린 그림이 적지 않았다. 중세의 어느 무명 예술가가 나무판에 그린 그림은 앞뒤로 전혀 다른 장면을 담았다. 앞쪽 면에는 선남선녀가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림을 뒤로 돌리면 남녀의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누구나 죽으면 썩어서 아름다움이라고는 남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렷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얼마나 성마른지, 이들 남녀는 숨이 끊어지지도 않은 채로 몸이 앞질러 썩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신의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묘사한 그림도 유행했다. <구소시에마키(九相詩絵巻)>는 제목으로도 짐작하듯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을 아홉 단계로 묘사했다. 귀한 집안의 여성이 숨을 거두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시신이 들판에 방치되어 부패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까마귀가 얼굴을 쪼고, 개가 내장을 물어 끄집어낸다. 살아 있을 때의 아리따운 모습과 처참한 지경에 놓인 시신이 아찔하게 대비된다. 수행하는 승려들에게 육체의 덧없음을 일깨우기 위한 그림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그런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탐닉을 엿보게 된다. 공포와 비참에 대한 탐닉이다.

미술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에 사진이 등장하면서 물줄기가 크게 바뀌었다. 사진은 죽음을 밋밋하게 만들었다.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전장의 시신을 찍은 사진이 널리 유포되었다. 사진에 담긴 죽음은 그 비참함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숭고함도 신비로움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제 예술은 죽은 다음 세상에 대한 희망이나 공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색채의 덩어리가 어딘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을 떠도는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신심도 희망도 사라진 시대에 죽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술은 사멸하는 인간의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하려 애쓰지만, 예술은 죽음을 직시하라며 조용히 권고하고 위로한다.
이연식 미술사가, 작가
미술사가. 미술과 관련된 저술, 번역, 강의를 한다. 『드가』, 『뒷모습』, 『예술가의 나이듦에 대하여』, 『죽음을 그리다』 등을 썼고 『르네상스 미술 : 그 찬란함과 이면』, 『그림을 보는 기술』, 『뱅크시 - 벽 뒤의 남자』 등을 번역했다.